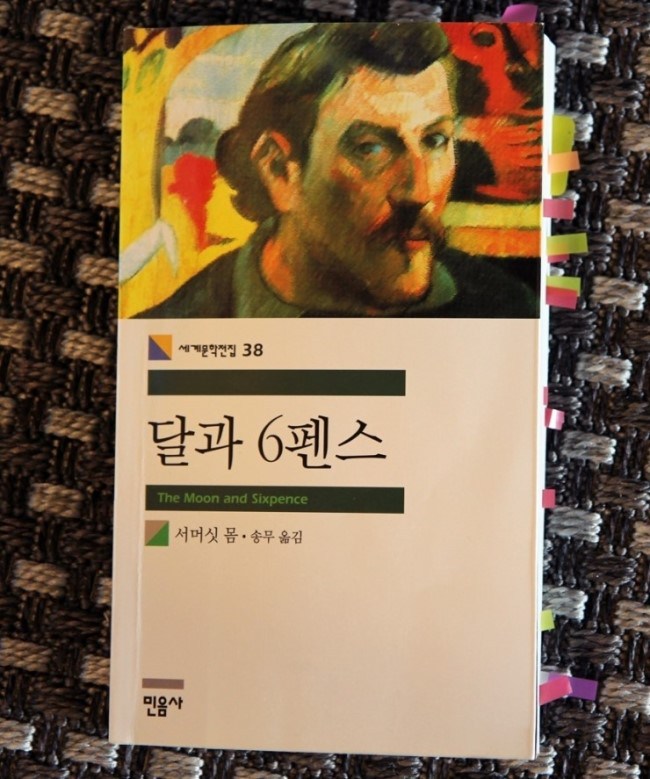얼마 전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럽사람들의 중산층 기준을 비교한 보도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30평대 아파트, 중형차, 그리고 월수입 얼마 이상인데 반해, 유럽사람들은 적어도 하나의 악기를 다룰 것, 남과 다른 요리를 할 줄 알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등. 설문 방식이 잘못됐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 반향은 적지 않았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집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에게 집은 곧 투자의 대상이었다. 집에 관한 이야기들은 온통해 평수, 수익률, 위치 등 수량화될 수 있는 외부 척도에만 관심이 집중됐다. 건축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축사조, 디자인, 구조 등 그 미학적 수사는 유려해도 정작 그 안, 집에 살았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고작해야 ‘무슨 집안의 어떤 벼슬을 한 누가 살았던 집’ 정도?
유형자산으로써 집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집 역시도 그 역사를 논할때 다양한 관점이 있을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그 안에 누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그들은 민도리집이다, 납도리집이다, 건축방식으로부터 비롯한 격식과 조선조의 신분제를 연결해보지만 권 옹은 선친이 무엇을 수리했고 그 나무는 어디에서 왔고 어느 목수의 손을 빌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기술과 전통을 이야기할 때 노인은 기억을 말한다. 사람들은 송석헌의 ‘겉’을 바라보고 노인은 그 집의 ‘안’에 살고 있다.” (p.130)
책 <아버지의 집>은 껍데기에 집착했던 우리의 집에 대한 시선을 내부로 돌린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보게 한다. 건축에 대한 이론적 탐구도 아니며 삶과 주거에 관한 거창한 철학적 담론도 아니다. 단지, 오래된 집에 살다간 한 노인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삶과 전통, 그리고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어왔던 생명체와도 같은 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권산은 갑작스레 방송사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된다. 며칠 후 전면 보수에 들어가는 경북 봉화에 있는 고택 ‘송석헌’에 관한 작업.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담당피디의 요청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저 일로써 접근했던 오래된 집과 오래된 사람, 두 낡은 존재와의 만남은 결국 그에게 잊지 못할 인연으로 각인된다. 아직도 전통방식의 유교적 삶을 고집하는 집주인 노인 권헌조와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여전히 집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부인의 거처, 그리고 이젠 초로에 들어선 아들이 어릴 적 뛰놀던 앞마당까지, 집 안팎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일가一家의 역사를 권산은 바라보고 또 기록했다. 그리고 2년여에 걸친 그 기록은 노인 권헌조의 꽃상여를 따라가며 끝을 맺는다.
“세상이 주목하는 삶은 대개 엄청나게 성공한 삶과 지극히 비극적인 삶, 두 종류다. 권헌조의 삶은 지극히 조용했기에 세상이 그에게 관심을 둘 이유는 없었다. 부모님의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매일 조석곡朝夕哭 을 하고 이후로도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걸음이 가능한 순간까지 아침저녁으로 산소를 성묘한 그의 삶은 기행으로 여겨졌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일상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주관이나 객관이라는 용어가 품은 의미보다 ‘사실’이라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강단 유학자도 아니었고 ‘옛생각’을 지켜야 한다고 설파하고 돌아다닌 전도사도 아니었다. 권헌조는 단지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다. 이것은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이 아닌 행동이다. 이제 권헌조와 같은 행동으로 일상을 빼곡하게 매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사라짐은 세상에서 유일했던 절대 소수 가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이별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것에 화가 났을 것이다.” (p.317)
노인은 말수가 적은 분이었다. 아니 거의 없었다. 권산의 표현을 빌자면, 좌중을 말의 ‘양’이 아닌 ‘질’로 집중시킬 수 있는 분이었다. 노인은 다큐멘터리 촬영기간에 입원을 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고택 송석헌이 호흡을 멈춤과 동시에 노인도 함께 숨을 거뒀다. 새로 단장할 고택의 겉모습은 깔끔히 변해 관광객을 맞이하겠지만, 당신의 집으로써 함께 했던 그 생명력은 이미 끝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노인 권헌조의 죽음은 한 자연인의 죽음이 아닌, 한 시대의 죽음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한때나마 우리와 익숙했던 떠나가는 시대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슬프다. 그리고 그 슬픔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집이 허락되지 않을 거란 예감에 배가된다. 이제는 ‘송석헌’과 같은 그 이름들조차 잃어버린, 켜켜이 기억의 나이테를 쌓아가며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 내려가는 그런 집 말이다.
등장인물의 말도, 글쓴이의 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책이다. 그래서 글과 사진사이의 여백은 더욱 커 보인다.하지만 그럼에도 그 울림은 깊고 넓다. 지나치게 형식화된 세상 틀이 갑갑할 때,한번쯤 펼쳐보길 권하고 싶은 책이다.